|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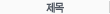 |
|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
|
|
|
|
해방 이전의 역사에서 임시정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소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신 듯합니다. 말씀 중에 보면 어쨌거나 정식 건국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봐야 하고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만일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단초로 인식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합방 직후의 독립운동 시작 시점까지 소급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고 하셨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멸망 이후, 즉 '한일합방' 이후 독립 운동의 기본 방향은 대한제국의 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즉 일본의 식민지라는 상태에서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왕(李王)으로 격하된 대한제국의 황제 지위를 되찾음으로써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사고가 그것이지요. 이른바 '복벽주의'로 불리우는 이러한 형태의 독립운동 기조가 꽃을 피웠던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고종황제의 죽음이라는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대한제국을 복원한다는 것이 지상과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3.1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크게 흔들리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1차대전 이후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보면서 더이상 복벽주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장 투쟁이나 실력 양성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열강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한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망명정부'의 필요성을 꺠닫게 되지요. 그리하여 당시 상해, 연해주, 한반도 등에 산재해 있던 세 개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복벽주의를 정식으로 청산할 것을 주장하고 새로이 독립된 대한민국은 공화정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을 의결하게 되지요.
임시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국가적 체제에 관한 밑그림을 그려낸 것이 바로 이 임시정부의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적을 무시하고 임시정부를 단순히 '항일에 관한 정신적인 전통'이라는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임시정부의 지위는 동북항일연군 같은 무장단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임시정부라는 명칭에 '임시'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식이 아니므로 건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원칙론(?)으로 설명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