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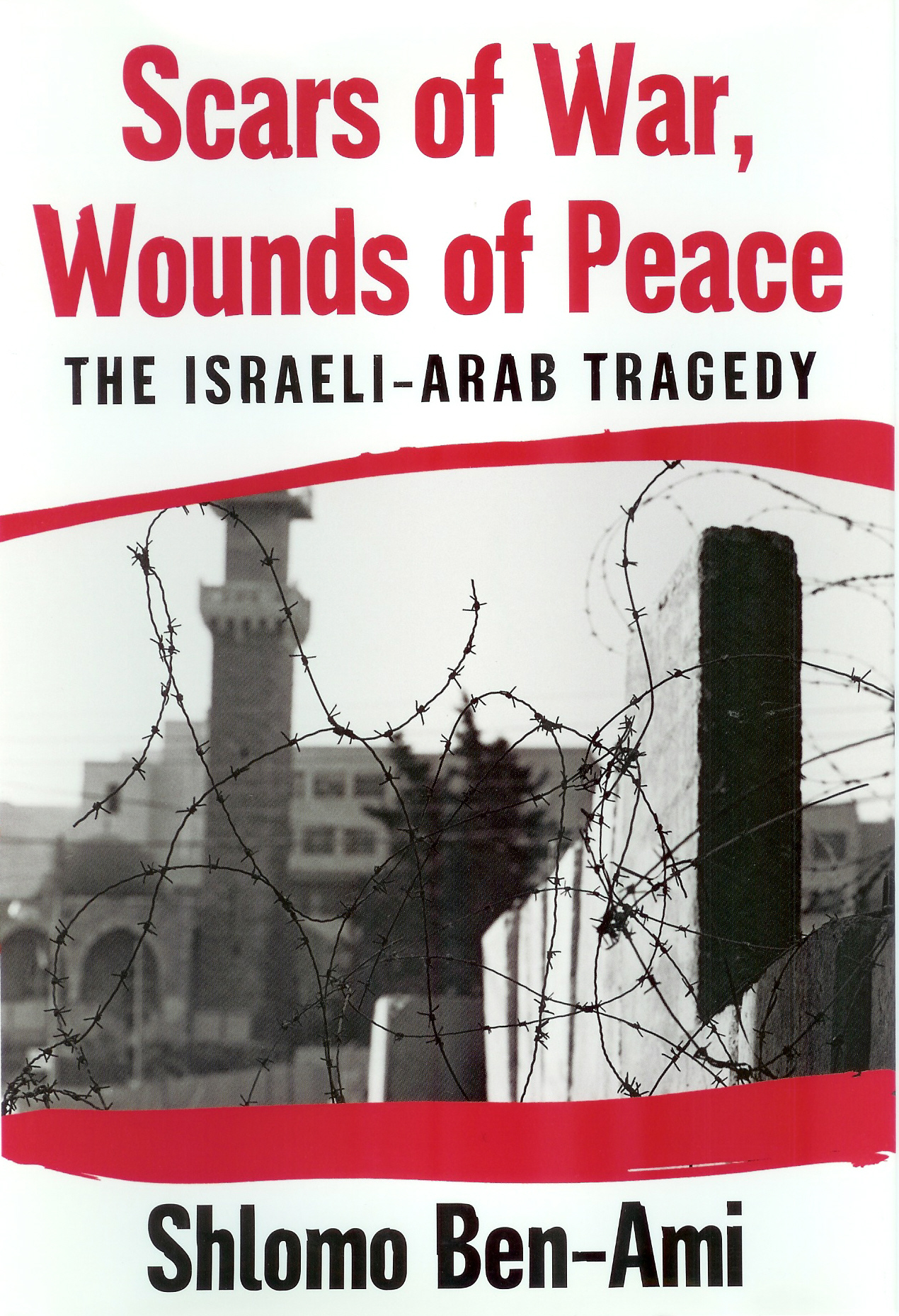
이스라엘과 아랍,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갔다
슐로모 벤아미, 전쟁의 흉터, 평화의 상처 (2006,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354쪽)
Shlomo Ben-Ami, Scars of War, Wounds of Peace : The Israeli-Arab Tragedy,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354 pages, $30.00)
2006년 초에 나온 이 책의 저자 슐로모 벤아미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며 외교관이다. 텔아비브 대학 역사학 교수 출신인 그는 스페인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으며, 1996년에는 국회의원이 됐다.
벤아미는 1999년 7월에 노동당의 에후드 바라크가 총리가 되자 공공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2000년 8월 클린턴 대통령이 초청한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상 도중 바라크 총리가 이끄는 연립내각의 레비 외무장관이 협상에 반대하면서 사임하자 바라크는 벤아미로 하여금 외무장관을 겸직하도록 했다.
저자가 장관으로 있던 기간 중 팔레스타인 제2차 봉기(‘인티파다’라고 부른다)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2001년 3월 선거에 의해 리쿠드黨(당)의 아리엘 샤론이 총리가 되자 저자는 일체의 정부 직책을 사양하고 역사학자로 돌아왔다.
평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외교관의 悔恨(회한)과 성찰이 담겨 있는 이 책은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분쟁의 기원과 그 발전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평화가 불가능했던 이유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 분쟁에 대해 아랍과 이스라엘이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스라엘 학자가 이런 견해를 내놓은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한다.
책은 2차 대전 후 유엔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하자 주변의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발생한 1948년 전쟁으로 시작한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네게브 사막 전체를 영토로 편입하는 등 승리를 거두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요르단 강 西岸(웨스트 뱅크)으로 몰려들었는데, 요르단은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합병했다.
저자는 이로 인해 일찍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상실됐다고 지적한다. 한편 전쟁 도중 아랍인들이 유대인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몇 건의 사건에서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군사력만이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6일 전쟁’ 승리의 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汎(범)아랍주의를 주창하자 이스라엘은 위기를 느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이며 당시 총리이던 벤구리언과 당시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이던 모세 다얀은 선제공격을 통해 이집트의 군사력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1956년 프랑스와 영국의 군대가 수에즈 운하에 진입하자 이스라엘은 시나이 半島(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이집트 군을 공격했다.
선제공격의 철학은 에쉬콜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1967년에 일어난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를 상대로 3면 선제공격을 전격적으로 벌여 시나이 半島, 요르단 강 西岸, 동부 예루살렘, 그리고 골란 高原(고원)을 장악했다.
저자는 당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나세르는 정작 전쟁을 할 의도도 없었고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군사적 성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6일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舊約(구약)에서 사마리안과 유대라고 부르는 웨스트 뱅크 지역과 ‘통곡의 벽’이 있는 동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방대한 시나이 半島(반도)를 장악하게 되어 별안간 帝國(제국)이 되었다. 승리에 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군부, 그리고 국민들은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傲慢(오만)과, 그들이 마치 메시아의 啓示(계시)를 달성한 것 같은 환상에 빠졌다.
반면 이스라엘은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도구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에쉬콜에 이어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는 에쉬콜 보다도 더욱 경직된 思考(사고)를 갖고 있었다. 메이어는 나세르가 사망한 후 대통령이 된 사다트가 제안한 평화협상의 기회를 무시해 버렸다.
‘6일 전쟁’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이 분쟁의 새로운 당사자로 등장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이 웨스트 뱅크를 점령함에 따라 무장 게릴라 투쟁을 주장하는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다. 정규군으로는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음을 알아차린 이들은 이때부터 온갖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평화협상이 지지부진하자 ‘6일 전쟁’으로 영토를 상실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1973년 가을에 ‘욤 키푸르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에서 이집트 군과 시리아 군을 맞아 苦戰(고전)했다. 이스라엘 군의 不敗(불패) 신화가 깨진 것이다.
전쟁 후 골다 메이어가 은퇴하자, 이즈하크 라빈이 총리가 됐으며 시몬 페레스는 국방장관이 됐다. 저자는 라빈이 탁월한 군사전략가였지만 정치에는 서툴렀고, 페레스는 강경파의 손에 놀아났다고 말한다. 라빈이 이집트와의 평화협상을 구상하자 페레스가 이를 견제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집트와 평화협정 체결 후 레바논 침공
1977년 총선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강경 우파 리쿠드黨을 지지해서 메나헴 베긴이 총리가 됐다. 다음해 베긴은 카터 대통령이 주선한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양국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시나이 반도에서 철군했다. 하지만 베긴은 유대인의 역사가 깃든 웨스트 뱅크에서 철군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
이집트와의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베긴은 이라크 핵 시설 공격과 레바논 침공을 감행했다. 그러나 남부 레바논에 진입한 이스라엘 군은 의외로 강경한 저항에 부딪쳤고,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입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자는 베긴이 당시 국방장관이던 아리엘 샤론에 의해 誤導(오도)되었다고 본다.
저자는 베긴에 이어 리쿠드黨의 총재가 된 이즈하크 샤미르 총리는 사실상 평화에의 장애물과 마찬가지였다고 혹평한다. 샤미르는 레이건 행정부의 중동 평화 이니시어티브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 1987년 말부터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에서 발생한 제1차 인티파타는 이스라엘을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었다. 1991년 초에 일어난 ‘걸프 전쟁’ 역시 이스라엘에게 큰 좌절을 안겨 주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퍼부었으나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다. 사우디 등 온건한 아랍국가와의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말도록 경고해 놓았기 때문이다.
‘걸프 전쟁’은 이스라엘이 미사일이란 새로운 전쟁수단에 대해 취약함을 잘 보여 주었다. 누구보다 라빈은 이런 현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1992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해서 라빈은 두 번째로 총리가 되었다.
오슬로 평화협정
1993년 9월 오슬로에서 라빈은 아라파트를 만나 평화협정에 조인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부가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의 대부분을 통치하도록 허용했고, 그 대신 아라파트는 폭력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승인하였다. 이어서 라빈은 요르단과도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라파트는 라빈의 기대를 간단하게 저버렸다. 하마스 등 강경한 집단이 평화협정에 반대하자 아라파트는 직접 테러를 지시해서 자신의 지위를 지켰다. 텔아비브 등 곳곳에서 自爆(자폭)테러가 발생했고 라빈은 크게 좌절했다. 이스라엘의 강경세력은 라빈이 양보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라빈을 비난했다. 1995년 11월 라빈은 유대인 극우청년에 의해 암살되었다.
저자는 라빈의 후임으로 총리가 된 페레스가 매우 무능했다고 본다. (노동당내에서 저자는 페레스와 정적(政敵)과 같은 관계였다.) 1996년 총선에선 다시 리쿠드黨이 승리해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가 됐는데, 저자는 네타냐후가 경험도 없을 뿐더러 예측이 불가능한 지도자였다고 혹평한다. 1999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다시 노동당을 지지해서 에후드 바라크가 총리가 됐으며 저자는 공공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이스라엘軍 총사령관을 지낸 바라크는 라빈과 마찬가지로 군사력으로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라파트는 사악한 인물’
2000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은 바라크와 아라파트를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저자는 바라크 총리를 수행해서 이 회의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구체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아라파트는 이 회의가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바라크 총리와 저자가 캠프 데이비드에 머무는 동안 본국의 외무장관이 사임했고, 집권연립정부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바라크는 웨스트 뱅크의 대부분과 동부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 넘겨주는 제안을 아라파트에 제시했다. 하지만 아라파트는 평화 무드를 깨기 위한 테러를 이미 하부조직에 지시해 놓은 후였다.
얼마 후 리쿠드黨 총재이던 샤론이 예루살렘의 템플 마운트의 아랍 지역을 방문하자 아랍인들의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고, 곧 이어 아라파트가 주도한 테러, 즉 제2차 인티파타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났다. 실낱 같던 평화에의 꿈이 사라진 것이다. 2001년 총선에선 샤론이 이끄는 리쿠드黨이 승리했다.
저자는 아라파트가 매우 사악한 인물이라고 지적한다. 아라파트의 전략은 끝이 없는 협상이며, 그의 무기는 테러이고, 무장민병대와 경찰관이 넘쳐 흐르는 그의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할 따름이다. 하마스 등 많은 테러세력과 경쟁을 하고 있으니 아라파트는 당초부터 평화에 관심이 없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국내정치가 양극화 되어 있는데다, 비례대표제로 인해 집권당이 의회의 안정의석을 구축하기 어려운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점령지를 양보하지 않고는 평화를 얻을 수 없는데도 땅을 양보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연립정부가 무너지는 것이다.
저자는 평화를 가져온 사다트와 라빈이 자국의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아랍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가 종종 잘못된 코스를 갔으며, 또한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린다.
(월간조선 2006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