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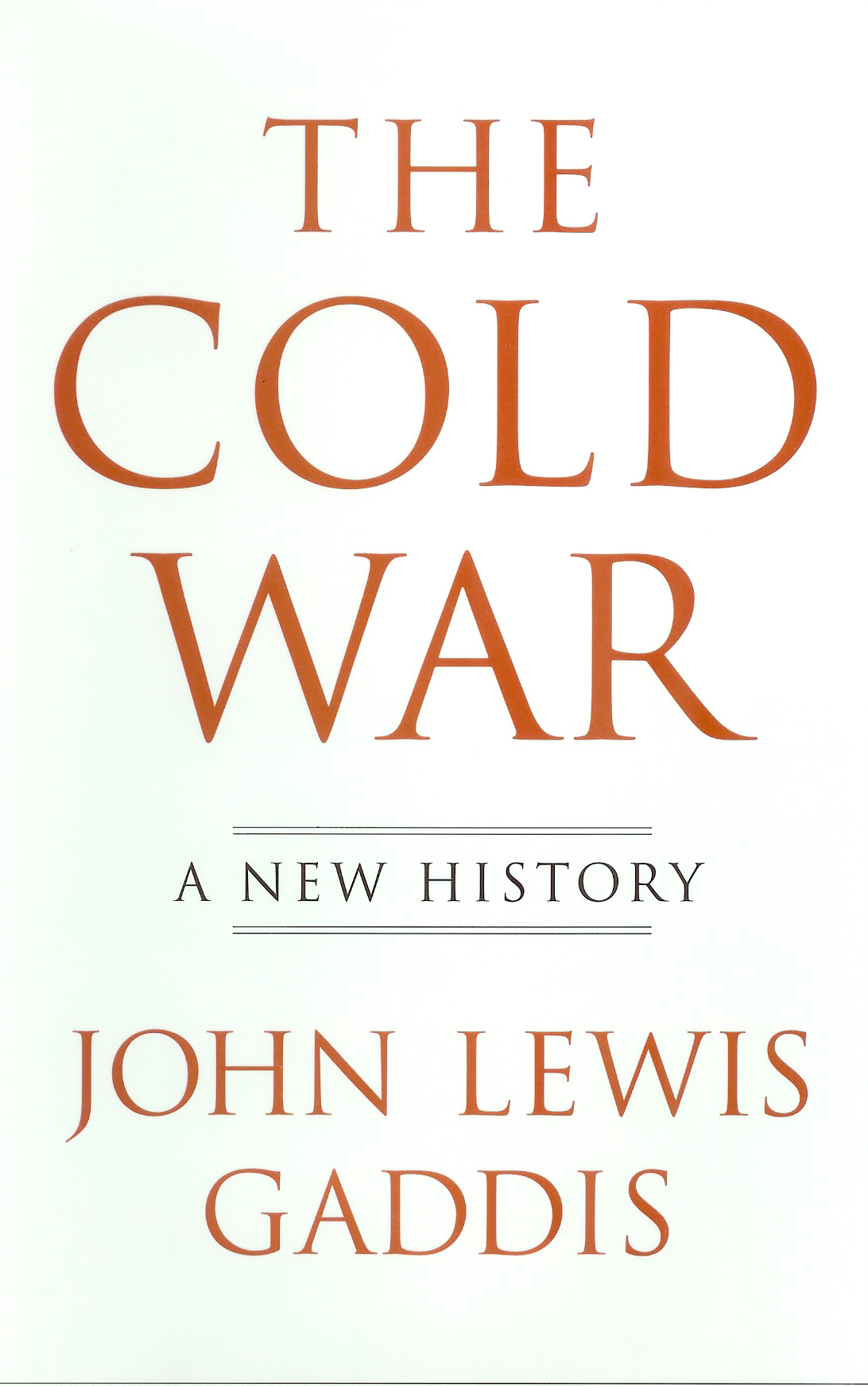
냉전의 시작과 끝을 보여 주는 정통 역사서
존 개디스, 冷戰(냉전) : 새로운 역사 (2005, 펭권 프레스, 333쪽)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 A New History (Penguin Press, 2005)
오늘날 미국의 역사학계는 좌편향 수정주의에 병들어 있다. 심지어 “아이비 리그의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미소(美蘇) 냉전시대를 연구해 온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 존 개디스 교수는 요즘 보기 드문 정통파로, 「이제 우리는 안다(Now We Know)」등 冷戰(냉전) 시대의 진실을 파헤친 여러 권의 저서를 펴냈다. 그의 최신작인 이 책은 冷戰의 시작과 결말에 이르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텍사스 주립대(오스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69년부터 오하이오 대학에서 냉전사 등을 가르치던 개디스 교수는 1997년에 예일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가르치는 ‘냉전사’ 강좌에는 수백명의 수강생이 몰려들어서, 학생들은 정통 역사를 배우고 싶어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책은 제2차 대전 종료와 스탈린의 동유럽 장악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세계 를 지배하고자 했던 소련과 달리 미국은 2차 대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종전 후 공산주의의 팽창을 그나마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조지 케냔의 봉쇄정책 덕분이었다. 저자는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주도한 남침계획을 스탈린이 승인해서 발생했고, 베트남에서 일어난 공산 게릴라 전쟁도 스탈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저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미군을 주둔케 한 것은 탁월한 전략이라고 본다.
저자는 흐르시쵸프가 쿠바 혁명을 낭만적으로 보아서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으며, 당시 쿠바에 설치된 핵미사일은 정말 사용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베를린 장벽 설치는 그 자체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패배를 인정한 사건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에는 세력균형론이 등장해서 소련과 평화공존을 도모하게 되었다.
닉슨 대통령 시대에 대외정책을 이끌었던 헨리 키신저는 냉전을 현실로 인정해서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키신저의 정책을 답습한 포드는 1976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이 냉전의 종식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폴란드 출신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취임하자 곧 그의 고국 폴랜드를 찾았다. 그는 폴랜드 민주화 투쟁을 이끄는 자유노조의 지도자 바웬사의 둘도 없는 후원자가 되어 동유럽의 공산체제가 붕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78년에 중국의 독재자 마오쩌뚱이 사망하자 노회한 개혁주의자 딩샤오핑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1979년 영국에선 자유주의 개혁을 내건 마가릿 대처가 총리가 되었고, 1980년 미국 유권자들은 영화배우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대처와 레이건은 “공산체제와의 세력균형을 통해 평화공존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을 거부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패퇴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레이건의 공격적 외교는 소련과 동유럽을 곤궁에 빠뜨렸다. 자본주의 개혁에 나선 중국의 딩샤오핑과 달리 소련의 새 지도자 고르바쵸프는 자본주의를 빌려 공산체제를 구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고르바쵸프는 실패했고 소련은 붕괴의 길을 가고 말았다.
저자는 冷戰이 종식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핵무기로 인해 어느 쪽도 전면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기술발전과 국경을 넘은 문화적 영향으로 군사력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은 독재체제를 불신했다. 소련 체제에 叛旗(반기)를 든 솔제니친과 사하로프, 공산 체코에서 저항운동을 이끌었던 하벨,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펼친 공산주의에 대한 정신적 도덕적 전쟁의 힘도 대단했다.
저자는 냉전으로 인해 한국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람들은 불안과 위기를 느끼고 살아야만 했으며, 軍備(군비)경쟁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됐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월간조선 2007년 1월호)